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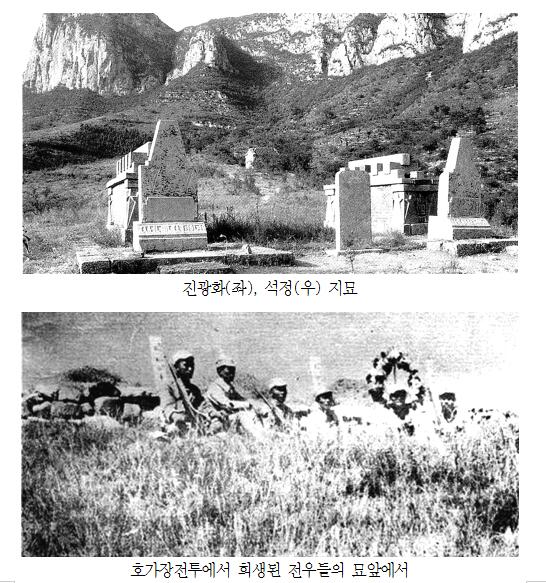 |
그날 밤 내가 여해암이에게 안날 길에서 겪은 아슬아슬한 장면을 재미나게 묘사해 들리는데 강진세는 한옆에 앉아서 생글거리기만 하고 말참녜는 하지 않았다.
“…어느 하가에 바지를 다 벗어, 그냥 물속에 들어섰지. 한데 일수가 사나우려니까 허둥지둥 물을 건느는중에 옹이에 마디로 무엇엔가 발이 걸려서 휘뚝 나가 자빠지잖았겠나. 꼴깍꼴깍 물을 먹으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디 일어나져야 말이지. 다행히도 작은아씨가 잽싸게 내 귀때기를 쥐여 잡아당겼기에망정이지 그러찮았더라면 젠장, 거기 그냥 빠져서 렬사가 될번한걸…”
내가 이렇게 너무 허풍을 떠니까 그제는 참을수 없던지 강진세도 웃음보를 터뜨리며
“또 시작했군!”
라고 한마디 말하고는 여해암이를 돌아보며
“저거 하는 말 하나도 곧이들을거 없어.” 했다.
“곧이들어?”
하고 여해암이는 익살맞은 눈으로 먼저 나를 한번 보고 다시 강진세를 보며
“저 인간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면 내가 곧이들을줄 알아?”
하고 맞장구를 쳤다.
세 친구는 서로 돌아보며 깔깔 웃었다.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정이 안개처럼 자옥해졌다.
|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