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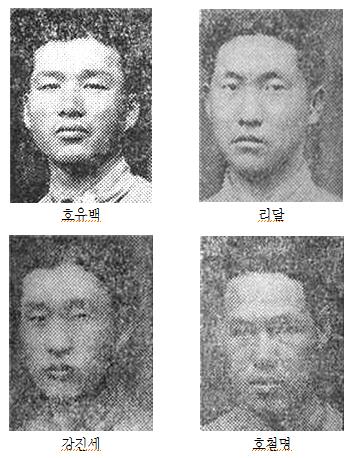 |
한주일이 지나서 생각지 않은 경사가 벌어졌다. 전구사령부소재지에 가지각색의 꽃들로 장식을 한 아치들이 세워지고 잇달아 승전을 경축하는 등불놀이가 성대하게 벌어진것이다. 우리는 눈만 끔벅끔벅하며 그 장관인 공연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우롱당하는 호북백성들을 마음속으로 동정하였다. 그들은 압박과 착취를 받는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또 릉욕을 당하고 기만을 당해야 하였다. 하건만 그 사령장관각하께서는 매 월요일 오전에 거행되는 손중산기념회에서 불쌍한 당지의 백성들을 분기가 충천해 꾸짖었다.
"이건 갈데없는 유태구역이야! 구두쇠들 같으니라구…"
우리는 이번 패전을 몸소 겪었으므로 그 속내평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경축대회가 끝난 뒤 장관사령부에서는 그래도 좀 창피했던지 대성 한알짜리 정치부주임을 우리 단위에 파견하여 사연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더 말할것없이 량해를 얻을 목적에서였다. 그 소장주임이 강화를 할 때 우리는 관례대로 회의기록원 두 사람을 배치하였다. 그들—리달과 강진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원석에 단정히 앉아서 직책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려는듯이 펜을 달리고있었다. 모임이 끝나서 례절바르게 손님을 바랜 뒤에 두 기록원더러 여태 적은것들을 한번 읽어드리라고 한즉 그들은 기꺼이 우리의 요청에 응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읽는것을 듣고는 다들 허리를 잡고 웃다가 나중에는 눈물까지 내였다. 그들의 그 엉터리기록은 내용이 완전히 서로 다른것으로서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욕설인데 그 어휘의 풍부함과 다채로움은 가히 욕설사전이라 할만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리백, 두보로부터 하이네, 마야꼽스끼에 이르는 동서고금의 이름난 시인들의 가지각색의 시구들을 모은것인데 동아에서 서구라파로 가로 뛰는가 하면 또 오늘에서 천년전으로 세로 뛰여서 엉망진창 볼썽모양의 잡동사니였다. 허나 애석하게도 그 두편의 기록문서는 벌써 오래전에 인멸되여 그 집필자들이 이미 대지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가 한줌의 흙으로 변한것처럼 그 형적조차 찾을길 없다.
그날 밤 당회의에서 김학무는 전원 북상해서 해방구로 들어갈것을 강렬히 주장하였다.
“이런 가짜항일전선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의 아까운 청춘을 허송한다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김학무는 동지들에게 호소하듯 한손을 앞으로 내밀고 엄숙한 얼굴들을 둘러보며 격앙해서 부르짖는것이였다.
군관학교에서 서로 사귄 뒤 그가 그렇게 격동하는것을 나는 이날 처음 보았다. 그의 평소의 상냥한 성품은 간데온데 없어지고 그 대신 드러난것은 마파람에 갈기를 휘날리며 버티고 선 수사자의 기백이였다.
“그래 이것도 항전입니까? 그래 이것도 혁명입니까? 우리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적이 제물로 거꾸러지기를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적들을 쓸어 내뜨려야 합니다. 동지들, 나는 래일 당장 대홍산에다 사람을 보내서 요청할것을 주장합니다. 견결히 주장합니다!…”
당시 우리의 지하당조직은 신사군 대홍산 정진종대 사령부 당위원회 소속으로서 서기는 호철명이였다. 호철명은 그후 태항산에서 부상을 당하였는데 야전병원에 약이 없어서 그만 파상풍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듬해 봄, 우리 전체 대원들은 세 부분으로 나뉘여 륙속 태항산항일근거지로 들어갔다. 김학무와 나는 제2진에 속해서 림현, 평순 등지를 거쳐 마침내 몽매지간에도 그리던 적후의 연안—동욕(桐峪)의 땅을 밟게 되였다.
|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
